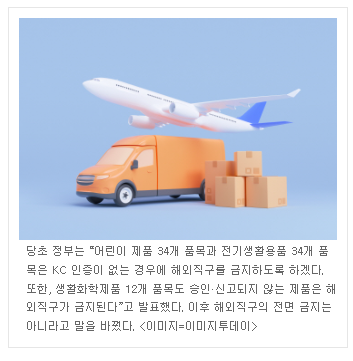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5월 14일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 사전 브리핑, 5월 16일 공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5월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3일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검토해본 적 없다”며 철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해외직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뉘앙스는 첫 번째 브리핑 내용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일 브리핑과 비교하면, 해외직구와 관련한 “워딩”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말바뀐 정부…80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다면” 금지라 했지만
당초 정부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다면”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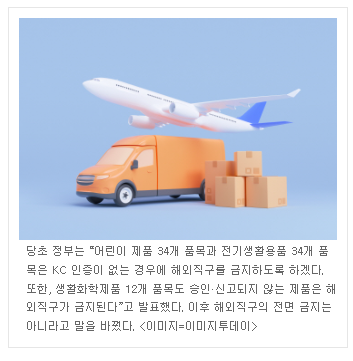
8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를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화장품 등에 대해 “사후에” 위해성 검사 등을 하겠다고 하면, 이와 다른 80개 품목의 경우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이해에 대해 정부는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해외직구 전면 금지는 오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입 차단”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위해성조사”를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정원 국무2차장은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는 처음부터 위해성 조사를 계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해성조사의 대상으로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안전 제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위해성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품목과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품목이 나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KC인증에 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인정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KC 인증 이외에 다른 인증을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개정을 할지말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현재 위해성조사에 따른 차단은 관세법 237조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위해성조사,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